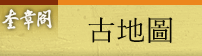문화현은 현재의 북한 행정구역으로 황해남도의 삼천군 북쪽 절반, 신천군의 서북쪽 일부, 안악군의 서쪽 1/3 정도에 걸쳐 있었으며, 읍치는 신천군의 건천리 부근에 있었다. 전체적으로 하천의 유로와 산줄기 및 수록된 내용이 본 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해동지도》, 《광여도》, 《여지도》(古4790-58)의 문화현 지도와 거의 동일하여 같은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도는 대체적으로 서쪽을 위로 향해 그렸는데, 읍치가 서쪽의 산을 등지고 있는 입지 방향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된 것은 읍치의 서북쪽에 있던 九月山城과 그 남쪽에 수없이 많이 들어서 있던 사찰이다. 구월산은 조선시대에 단군 조선의 신화와 결부된 산으로 여겨져 신성시되었던 곳 중의 하나이다. 또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채택된 대형산성 위주의 방어체제에 부응하여 구월산성이 축조되어 있던 곳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징적 측면 때문에 구월산성과 그 주변이 가장 자세하게 묘사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읍치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이 모여 오른쪽 아래로 빠져나가는 하천은 재령강의 지류인 서강의 상류에 해당된다. 지도의 왼쪽 위에는 작은 하천 하나가 그려져 있고, 興徃面이라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이곳은 현재의 삼천군 金川里 부근으로 실제로 장연을 거쳐 서해로 빠져나가는 하천의 최상류에 해당된다. 《해동지도》에도 본 지도처럼 그려져 있어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광여도》와 《여지도》에서는 하천의 모습이 생략되어 있고 興徃面의 위치가 산줄기의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다. 후대의 필사자가 실제의 사실을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지도의 내용을 바꾸면서 오류를 범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자의적 변경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고을을 물줄기와 산줄기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풍수적 명당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이기봉)